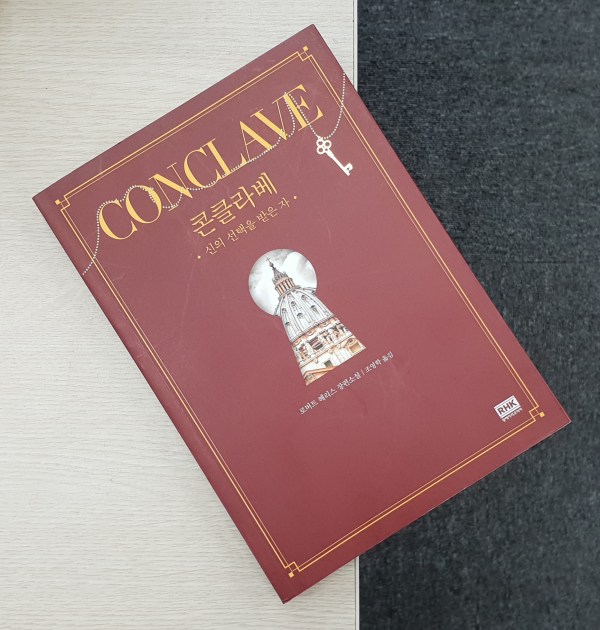우리가 읽는 서양미술사는 대체로 남성 후원자와 남성 화가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남성 미술사가가 요약한 결과물이다. 여기서 여성의 이름은 아주 제한적으로 등장한다. 브리짓 퀸(Bridget Quinn)의 '여성 예술가론'은 H. W. 잰슨(Janson)의 기념비적 「서양미술사(History of Art)」에서 단 16명의 여성만 등장한다는 새삼스러운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시작되었다. 이 책은 잰슨에서 언급된 16명 중 2명을 포함한 15명의 여성 예술가들을 다룬다. 이러한 선정은... Continue Reading →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의 「모두 거짓말을 한다: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
끝내주는 책이다. 너무 황홀한 나머지 표지를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이다. 이렇게 과격한 칭찬을 해야 하는 이유는 표지의 디자인 수준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경영 분야의 서적 중에서 이렇게 싸구려 스티커 무늬를 여기저기 찍어 놓은 표지들이 유난히 눈에 띄는데, 이런 책을 지하철에서 펼치면 얼굴이 후끈 달아 오르는 것 같다. 실력은 없는데 오로지 성공에만 눈 먼 흙수저가... Continue Reading →
마쓰다 유키마사의 「눈의 황홀: 보이는 것의 매혹, 그 탄생과 변주」
시각성에 대한 근원을 추적하는 책이다. 언제부터 속도에 대한 묘사가 생겨났을까? 직선, 나선, 쌍, 연속과 같은 개념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서 의구심을 갖기 힘든 이러한 개념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은 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중고책방에서 만난 이 책이 그러한 호기심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소재도 좋고, 포괄하는 범위도 넓고, 자료도 빵빵한 책인데 더럽게 재미 없다는 것이... Continue Reading →
올해의 작가상 2018 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올해의 작가상 2017 展>을 보고 통인시장에 들러 먹었던 고로케의 기름맛이 아직도 선명한데, 어느덧 2018년의 작가를 뽑고 있다. 미술계의 연례행사로 '한 해'라는 작위적인 시간 단위를 새삼 상기한다. 어찌보면 1년의 시간을 전시로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동차세 납입이나 건보료 인상 따위로 지각하는 것 보다야 훨씬 낭만적이다.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의 터너 상(Turner Prize)에서 영감을 받은... Continue Reading →
2018 우양 소장품: 예술가의 증언 展 (우양미술관)
우양미술관 1층에서는 낙서展이, 2층에서는 소장품展이 열리고 있다. 이 작은 미술관에서 왜 굳이 공간을 쪼개어 두 개의 전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관람객 입장에서는 한 번에 두 가지 사유를 끄집어 낼 수 있으니 좋은 점이 있다. 아무리 작은 전시라고 하더라도 기획할 때 드는 육체적/정신적 소요는 대규모 전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문을 쓰고, 브로셔를 만들고, 동선을... Continue Reading →
그래피티: 거리미술의 역습 展 (우양미술관)
늘 강조하지만, 전시의 성과는 작가의 이름값이나 작품 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품과 그것의 배치가 우리에게 어떤 사유의 확장을 가져오는지, 우리 삶에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주 힐튼호텔에 자리한 우양미술관의 <그래피티: 거리미술의 역습 展>은 작가의 이름값도, 작품 수도 청담 K현대미술관의 낙서展에 훨씬 못 미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전시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알타임 죠(Artime... Continue Reading →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그때의 나, 지금의 나 출장을 떠나며 10년 만에 다시 하루키를 꺼내들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럴만한 시기이다. 처음 이 책을 읽었던 20대의 나는 세상과 사람을 너무 몰랐다. 작품 서두(12p)에 나오는 말처럼, 모든 생각들이 빙빙 돌아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나 자신에 대한 사유의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 나 이외의 모든 타자는 마치... Continue Reading →
로버트 해리스의 「콘클라베(Conclave): 신의 선택을 받은 자」
거룩한 성의를 걸친 종교계의 흑막을 열어 젖히는 이야기는 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로마 가톨릭은 지난 2000년 간 박해의 상징으로, 시대의 율법으로, 구습의 망령으로, 혹은 평화의 또 다른 이름으로 적절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찬란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기에, 그 내막에 대한 궁금증도 더불어 커져간다. 종교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비를 동반하며 그 생명을 유지하기... Continue Reading →
이충렬의 「그림으로 읽는 한국 근대의 풍경(2011)」
처음에 목차를 훑어보니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두서 없이 짜깁기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산만하고 가벼운 책일 것 같았다. 대체로 '그림으로 읽는 어쩌구저쩌구' 류의 책이 안겨줬던 실망감이 늘 그런 것이었다. 화려한 그림으로 시선을 끌고 흥미를 자아내지만, 이야기에는 깊이가 없고, 작품 해석에서도 한계를 드러내며 역사와 그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그간 교육적인(≒고리타분한) 책을... Continue Reading →
샤갈: 신비로운 색채의 마술사 展 (해든뮤지움)
올해 우리나라에서 세 개의 샤갈 展이 동시에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같은 작가, 비슷한 작품을 다루더라도 각 미술관(기획사)의 역량과 관점은 제각각이다. M컨템포러리는 천박한 물량공세를, 예술의전당은 잘 정돈된 교과서를 보여주었다. 세 샤갈 展의 마지막 퍼즐인 해든뮤지움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서울에서 열린 두 전시와 마찬가지로 판화에 집중하였고, 작품의 주제들도 상당부분 겹쳤기 때문에 큰 특색은 없는 전시였다. 다만 같은...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