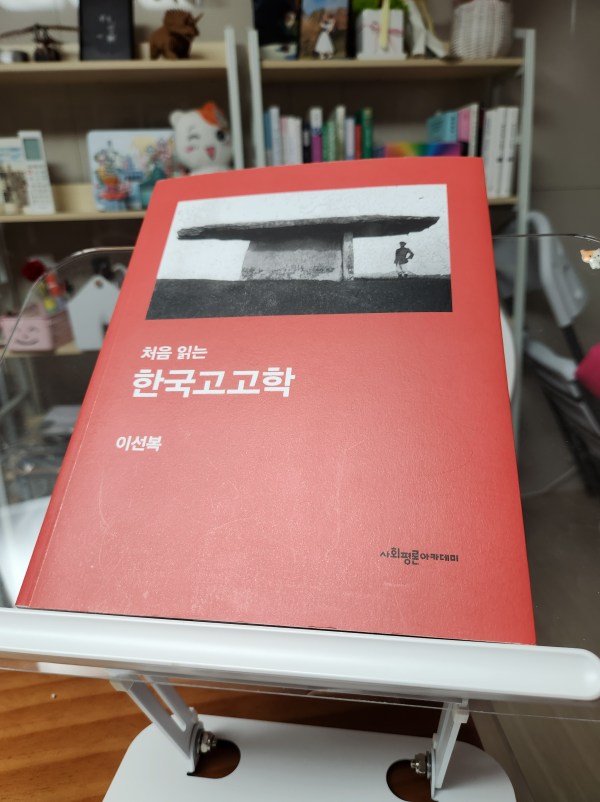그간 미술사에서 간과되었던 재일조선인 예술가들의 작품활동과 생활상을 추적한 연구서다. 재일조선인 3세인 연구자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 살을 붙여가며 대중서로 펴냈다. 연구자들이란 자기 정체성이 투영된 연구에 가장 몰입하는 법이다. 학술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거의 없고, 자료도 부족하고, 관련자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시점에 저자는 반드시 그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이 작업을 완수했다. 이미 일본이나 한국 미술계에 이름이... Continue Reading →
이영욱 외 편저, 「비평으로 보는 현대 한국미술」
내 서고에 애지중지 아끼는 두 권의 선집이 있다. 하나는 도널드 프레지오시(Donald Preziosi)가 엮은 「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 40선」이고, 다른 하나는 로버트 S. 넬슨(Robert S. Nelson)과 리처드 시프(Richard Shiff)가 엮은 「꼭 읽어야 할 예술 비평용어 31선」이다. 둘 다 미진사에서 번역한 작품이다. 미술사와 비평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개념, 이론, 사례들을 망라한 선집이라 한창 학구열이 불탔을 시기에 시야를 넓히는 데... Continue Reading →
여름 열림 Open Studio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오픈스튜디오)
투사와 기념비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짧은 식견에 비춰볼 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의 전반적 시설이나 작품 수준, 행사의 준비도는 꽤 훌륭했다. 단순히 작업공간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 구석구석에 여러 전시 공간을 마련해 두었는데, 그 안에 모인 작품들의 결이 은근히 통하는 듯, 어긋나는 듯하여 왜 이 구성으로 모아 두었을지 유추하는 재미가... Continue Reading →
김경섭의 「미친놈 예술가 사기꾼」
작품으로 말할 방법은 분명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술을 완전히 뒤집는다!”라는 도발적인 캠페인 문구를 달고 있는데, 내 경우 사실 딱히 뒤집히는 것이 없었다. 저자가 새로 찾아낸 정보란 거의 없고, 그나마 얄팍한 정보도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고,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골자도 사실 내 평소 지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예술에 관한 통념이 뒤집힌... Continue Reading →
조새미의 「뮤지엄 게이트」
감상적 여행기의 한계 저자가 나름 전공한 연구자이길래 박물관학이나 큐레토리얼에 관한 연구서인 줄 알고 무턱대고 집어 든 내 잘못이다. 연구서가 아닌 여행기다. 저자 본인이 체류했던 미국, 영국, 일본 등지의 뮤지엄들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으로 가득한 책이다. 감상적 여행기라는 정체성은 각 챕터의 서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뮤지엄의 대표작 한 점이 저자에게 친군하게 말을 거는 식으로 시작하는데,... Continue Reading →
이선복의 「처음 읽는 한국고고학」
지식의 고고학, 그리고 진짜 고고학 제목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의도에 충실했다. 내가 처음으로 읽은 고고학책이다. 오랜만에 선사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고고학적 이미지들을 쭉 훑어보자니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봤던 오래된 도판들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그때 새 교과서를 받으면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들춰봤던 과목들이 미술, 사회과 부도, 그리고 역사(혹은 국사)였다. 도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과서들이다. 아날로그에 둘러싸인 채 태어나 서서히 디지털에... Continue Reading →
한강의 「그대의 차가운 손」
진실과 껍데기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진실과 껍데기 사이의 간격이 있다. 인간의 마음속 최종적 심급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거지를 좌우하는 진실이라는 국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람에 따라 두터운 껍데기에 꽁꽁 싸여 철저한 보호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투명한 막으로만 둘러쳐져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존재감을 언뜻언뜻 내비칠 수도 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진실과 껍데기의 간격은 가까울수록 좋다.... Continue Reading →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의 「민중들의 이미지: 노출된 민중들, 형상화하는 민중들」
Georges Didi-Huberman, Peuples exposés, peuples figurants 이미지와 사유는 민중들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문법적으로 ‘민중들’이라는 말은 없다. 민중, 대중, 국민 등 집합명사는 이미 집합을 가리키므로 복수형으로 쓸 수 없다. 저자 디디-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이나 역자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도 이 책은 묵직하게 끝까지 ‘민중들’을 강조한다. 저자가 주인공으로 지목한 민중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역사적 거대서사의 주인공이 아닌, 시각문화의... Continue Reading →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Dear Evan Hansen,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뮤지컬, 결국 음악의 힘 스포티파이를 깔고 나서 초창기에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알게 된 아티스트가 벤 플랫(Ben Platt)이었고, 그의 첫 정규 앨범 <Sing to Me Instead>가 딱 내 취향이어서 한동안 열심히 들었었다. 그때까지는 그가 뮤지컬 배우인지도 몰랐다. 이후 넷플릭스에서 영화판 <디어 에반 핸슨>을 봤는데, 음악이 정말 좋았고, 목소리가 낯익었다. 그때 ‘그 배우’가 ‘그 가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Continue Reading →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 展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비욘드’는 어디에 한 사람의 예술가를 단 하나의 작품으로만 평가하지 말라. 아주 확고하고 저명한 대표작이 있는 작가의 회고전이나 특별전을 기획할 때 빠지지 않는 메시지다. 이러한 예술가를 다루는 기획자는 결국 대표작의 늪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언급하려니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가려지고,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려니, 보편적 대중의 기대치와 멀어져 상업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진주 귀걸이...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