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çois Dosse, Histoire du structuralisme
역자의 죽음: 중도 하차할 용기
지금까지 이 홈페이지에 올린 서평 중 어떤 책을 다 읽지도 않은 채 쓴 글은 없었다.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중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자랑스럽게 지켰던 셈인데, 이번에는 그 원칙을 포기한다. 총 네 권의 시리즈 중 3권 중반부에서 하차한다(참고: 원서는 2권짜리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변명처럼 들린대도 어쩔 수 없다. 번역이 구리다. 구려도 너무 구리다. 관용과 인내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다.
1권은 괜찮았다. 2권부터가 문제다. 1권에서 2권으로 넘어오자마자 번역이 급격히 구려지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가 있다. 누구라도 그것을 똑같이 느끼리라고 자신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 구조에 걸맞지 않은 괴상한 문장 구조들이 잇달아 튀어나온다.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 문장을 왜 이따위로 썼을까, 다르게 수정할 수는 없었을까, 꼭 이렇게 직역해야만 했나, 등 지엽적 차원에서만 사고가 계속 맴돌다 보니 20세기 중반의 파리 사상계로 훨훨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꿈은 산산이 부서진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부서지고 또 부서진다. 그러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간다. 이 투쟁을 4권까지 이어 나갈 자신이 없다. 설렘 가득해도 모자랄 연말을 분노와 갑갑함 속에 통째로 소진할 수야 없지 않은가. 이건 포기가 아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퇴다.
1권은 여러 학자가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서 파트를 나눠 번역했다. 사실 이런 방식이 성공을 거두기란 쉽지 않은데, 2권으로 넘어가 보니 그 쉽지 않을 일을 1권이 해냈음이 증명된다. 2~4권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웅권 교수가 전체를 홀로 번역했다. 출판사는 왜 그런 악수를 뒀을까? 구조주의의 물결이 ‘저자의 죽음’을 선언케 했듯, 구조주의의 역사를 다룬 이 책의 단독 번역자가 ‘역자의 죽음’이라는 사망진단서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셈이다. 집단지성은 위대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데리다(Jacques Derrida), 푸코(Michel Foucault), 바르트(Roland Barthes), 알튀세르(Louis Althusser)를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책에 닿았다. 역시나 절판된 지 오래였다. 내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만났을 때, 오직 1권만이 개방형 서고에 꽂혀 있었고, 나머지 2~4권은 저 깊은 연옥과 같은 보존서고에 차갑게 갇힌 채였다. 도서관은 서고의 물리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오랫동안 선택되지 않는 비운의 책들을 보존서고에 넣어 두고 요청이 있을 때만 내어준다. 2~4권을 받아 들어 보니 지난 20여 년간 아무도 찾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였다. 어떠한 열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출판사에서 출고할 때 끼워주는 책갈피 형태의 홍보물도 고스란히 출고 당시 모습으로 온전히 끼어있었다.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채 보존서고로 들어간 2~4권의 슬픈 운명은 이 책의 난이도와 매니악한 측면에서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1권과의 번역 수준 차이와 맞물려 생각해 보면 더욱 의미심장한 은유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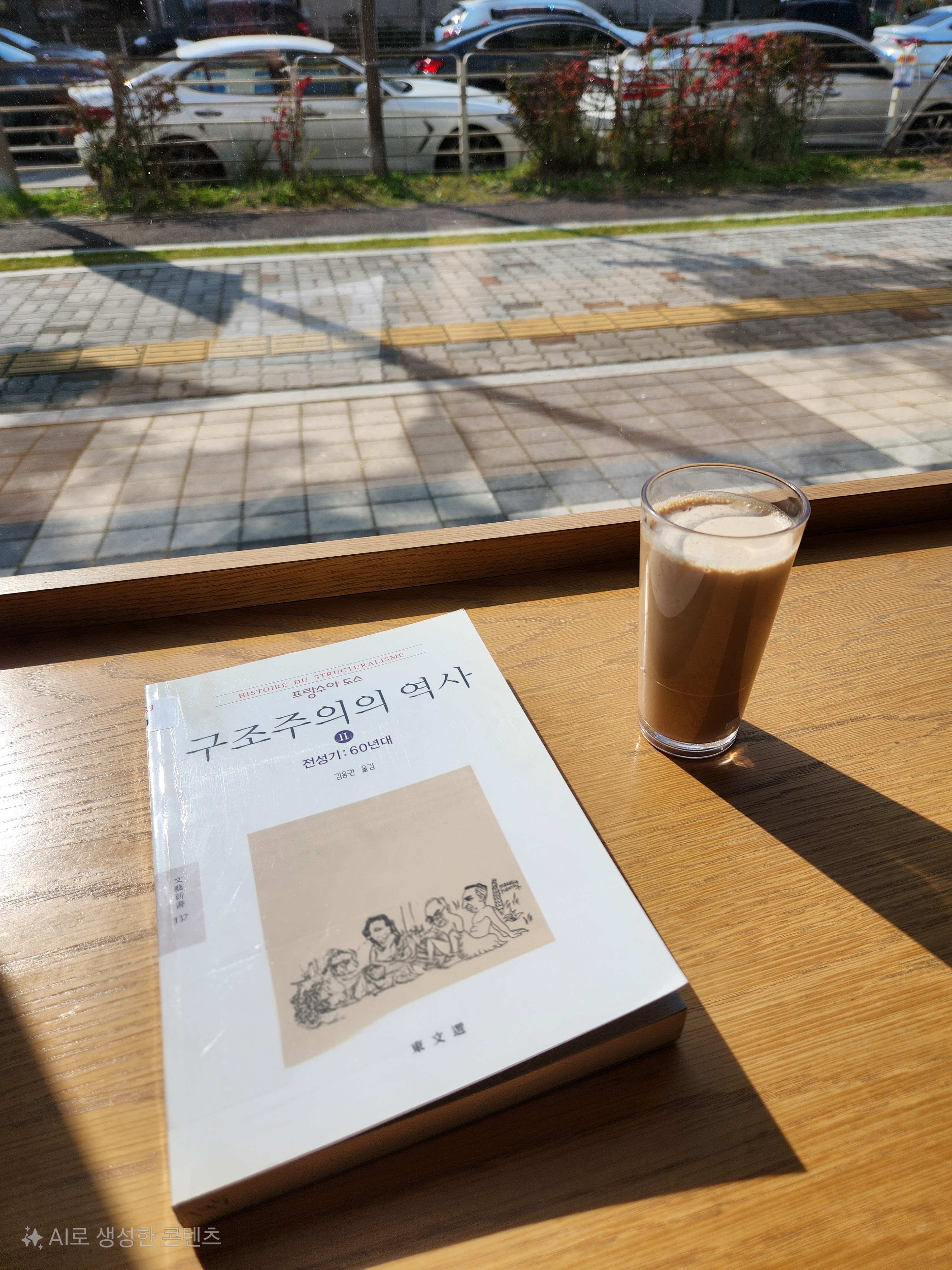
이보다 더 나가면 자신의 독해력 부족을 역자의 탓으로 돌린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번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여기까지만 던지도록 하자. 내용 자체는 놀랍기 그지없다. 20세기 중반의 파리에 한정하여, 서양철학사를 통틀어서도 유례없이 분출했던 지적 열기의 다채로운 경향들을 이처럼 세세하게 독파해 낸 저자 프랑수아 도스(François Dosse)에게 경의를 보낸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자와 저술을 모두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축약해 낼 수 있었을까? 구조주의의 중심에 있었거나 주변을 서성거린 인물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커피를 사야 했을까? 저자는 언어학, 역사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심지어 수학계까지 모든 분파 학문에 미쳤던 구조주의의 파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조망해 낸다. 분파마다 충분히 깊숙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이해의 수준이 절대 얕은 것도 아님은 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당시 사상계를 뒤흔들었거나, 미미하게라도 물결을 일으켰던 모든 인물의 전기들을 축약해 놓은 초록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 저자의 주요 주장, 서로 대립했던 경향들, 사적 욕망과 다소 일그러진 자화상까지 폭넓게 아우르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넓고 깊게 문헌들을 섭렵해 나갔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어떤 대목에서는 특정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조 전반을 저자 자신의 독해로 온전히 풀어가기도 하는데, 이 대목은 아마 저자의 이해도가 가장 높고 뚜렷한 자기 관점이 분명히 서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36, 37장). 저자는 단순한 시대의 관찰자라기보다 적극적 해석자로서 구조주의의 흥망성쇠를 풀어낸다.
사실 나는 늘 그렇듯 학자들의 저술보다는 그들의 사생활에 더 관음증적으로 끌린다.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기대했으나, 기대만큼 학자들의 사적 삶을 넉넉히 다뤄 주지는 않는다. 아마도 저술 당시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 당사자와 유족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라캉의 돈 욕심과 상술(1-158p), 쟁쟁한 학자들의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첨예한 논쟁(1-208p), 사소한 농담 끝에 결별한 이들의 에피소드(2-107p) 등은 고된 읽기의 여정 속에 적절한 양념이 되어 주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으며 주요 학자들의 핵심 주장들과 구조주의의 미시적 분파들에 대해 상당한 분량의 메모를 남겼지만, 이를 다시 글로 풀어내 이곳에 정리하지는 않으련다. 감히 완주도 못 한 주제를 파악하련다. 다만, 유례없이 들풀처럼 피어올라 68혁명의 광기와 함께 제도권에 안착함과 동시에 빠르게 식어갔던 그 열기를 오늘날 시공간적으로 멀찍이 떨어져 바라본 소회만을 남길 수 있을진대, 그것은 결국 거칠게 요약하자면 다소 삐뚤었던 사상적 균형을 맞추는 또 하나의 거대한 다림쇠가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구조주의는 역사라는 거대 서사에 얽힌 문명의 발전 궤적에 대한, 그리고 이성적 인간 주체의 합리적 사고력과 실존성에 걸린 과도한 믿음에 대한 회의적 지평이 움켜쥘 수 있었던 당대 가장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무기였다. 구조주의자들은 역사성을 배제하고 동시대 구조적 틀 안에서 차이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체의 고유한 이성과 합리성보다는 에피스테메에 구속된 현상이라는 관점으로 일련의 행동과 제도를 이해했다. 지금에 와서는 주체와 역사가 배제된 ‘순수한’ 구조주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약과 혁신이 존재함을 알지만, 구조주의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갔기에 오늘날 우리는 구조에 구속된 자아와 진정한 내면의 갈망을 분별해 보려는 헛된 시도나마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동시대 예술, 제도, 권력을 비판 인문학의 무대에 올리려면, 구조주의적 토대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구조주의의 광풍이 잦아들고, 그 중심에 서 있던 거목들이 구조주의자라는 수식어를 스스로 걷어찼음에도 여전히 그렇다. 우리는 구조주의 이후로 찰나의 한때나마 주류로 부상했다고 평가할 만한 그 어떤 사상적 흐름도 목격하지 못했다. 현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변혁적 주장이었던 이 흐름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이해할 때, 우리는 칸트로부터 니체에 이르는 폭넓은 사상적 스펙트럼을 동시에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구조주의의 빛나는 주연들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래서 더욱 심층적인 독서의 시발점 구실을 톡톡히 해낼 만한 이 ‘다중 전기 초록집’의 재번역 및 개정판 작업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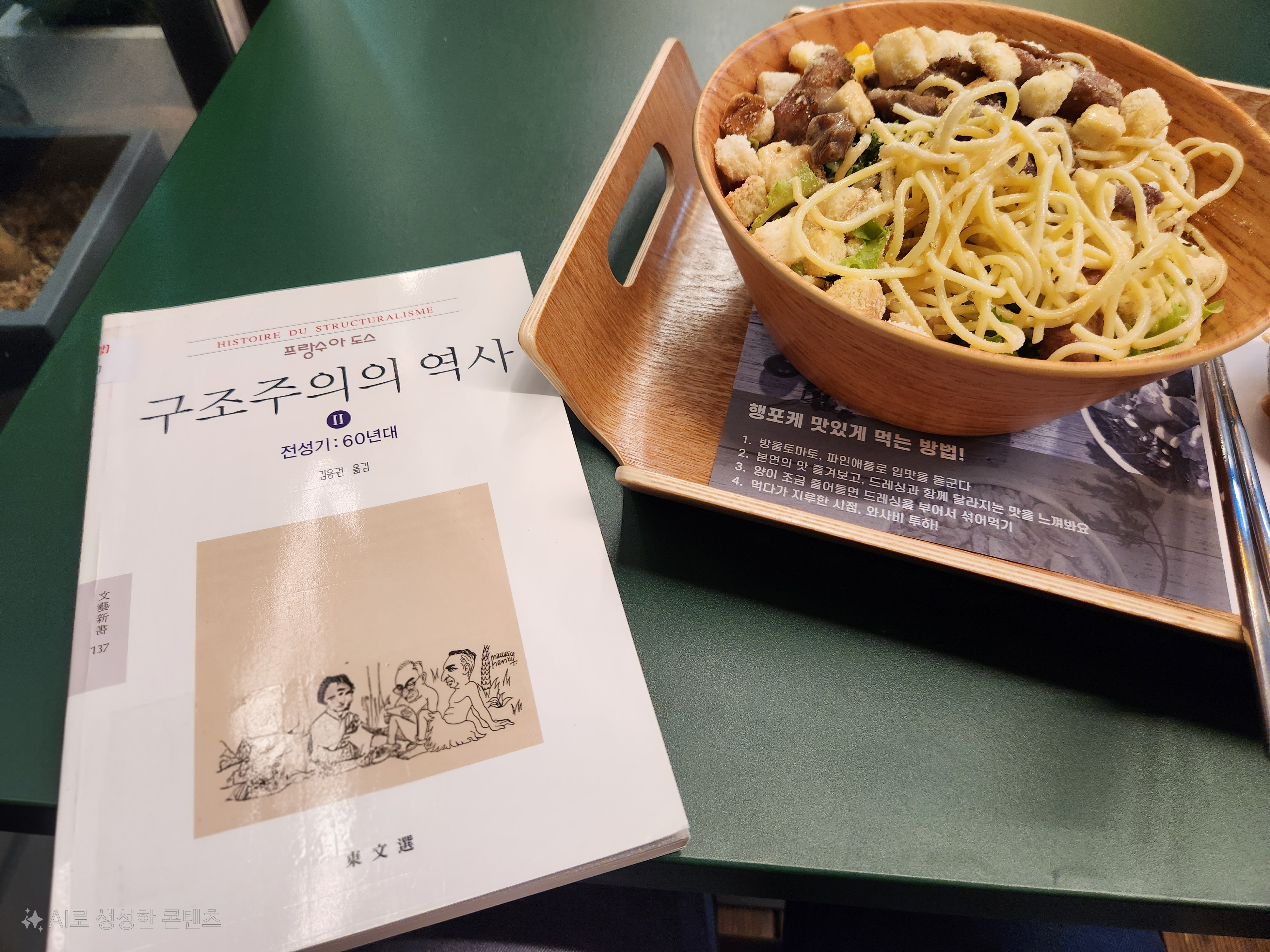
No Day But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